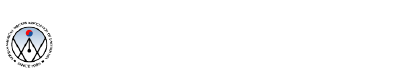문학강좌 기행문
노 려
친정어머니와 남편이 저녁 밥상을 대충 따로 따로 차려놓고는 부랴부랴 화이트 스톤 브리지를 건너, 김자원 회장님 댁을 찾아갔다.
그 동안 못 보던 얼굴을 보려는 마음이었다.
지난 3월, 문학강좌 모임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도, 임혜기 씨가 소설에 대해서 '뭔 말씀을 하시려나' 궁금하기도 했지만, 내 속셈은 그저 보고 싶은 얼굴들을 만나 보고 싶은 것이었다. 쉽게 나타나지 않은 156가를 찾아 골목을 돌고 돌아서 47-37이라는 주소에 다달았을 때, 김자원 회장께서 '요가 클래스를 하시는구나'했다.
카피 페이퍼에 써 붙인 요가 간판이 '호호호..' 온 몸으로 웃음을 자아내시는 주인을 꼭 닮아서 회장님이 조금 더 가까워진다.
소설가 임혜기 씨가 목청을 다듬으며 "소설은 요..." 강의를 시작하자, 20년을 알고 지내는 임혜기 씨를 순전히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앉아 있는 것이 좀 어색했다. 맞아. 그 중에 하나쯤 읽어볼까 말까한 수천수만이 소설들, 그 하나하나가 저렇ㄹ듯 내가 잘 알고 있는 임혜기 씨와 같은 사람들이 쓰는 것이겠구나. 그날 임혜기 고문이 '젖국 냄새'라는 표현의 예를 들었던 김훈의 '칼의 노래'를 나는 남들보다 10년을 늦게 읽어보게 되었다.
지난달, 비행기 타기 싫다는 어머니를 모셔오려고 한국엘 갔다 오는 바람에, 수필가 정재옥 고문의 문학강좌는 놏쳤었다. 어린애 같아진 친정 어머니를 변덕스런 뉴욕 날씨에 하루 씩 챙기다 보니, 5월 문학 강좌 소식이 숨통이 터지듯 반가왔다. 자칭 '문학소녀'인 82세 엄머니 앞에 딸이 밤에 나돌아 다니는 명목도 떳떳하게 " 엄마. 나 오늘 문인협회에 가" 하고 나왔다. 회장님이 매달 이런 자리를 만드시는 것이 고맙기만 했다.
푸성귀를 푹 끓여낸 국과 온갖 야채 반찬에 김송희 선생님이 가져오신 다시마와 호도가 든 콩자반까지 곁들인 진수성찬을 먹으며, 겨우 낯을 익힌 얼굴들과의 반가운 눈웃음도 자연스러웠다. 집에서 맛 없는 식사를 했을 남편과 어머니 생각은 추호도 없이, 내가 문인협회 회원인 것을 마음껏 누렸다.
내 평생에 두세번 얼굴을 대했던 최정자 고문의 강의 제목이 '시의 양면성'이었다. 양면이라니? 겉과 속이 다른 인간의 양면성에는 자주 신경이 곤두서곤 했지만, 시에 무슨 양면성이? 정신을 집중하여 강의를 듣기 시작했다. 문학 강좌 준비를 하면서 전에 없이 별수 없이 느끼신 나이에 대한 이야기, 먼 옛날 한국에서 있었던 가슴 저린 제목 표절이야기, 소설도 시도 모두 쓰는 이의 현실이 반영된다는 문학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글은 수도 없이 많이 자꾸 자꾸 써야 된다는 가슴 찔리는 이야기들을 신입생 답게 열심히 들었다.
겉으로만 알던 최정자 고문의 인생 단면과 지나간 세월 만큼 쌓여진 그 분의 인품이, 좀 뿌옇긴 해도 현실을 반영하는 하나의 그림으로 내 눈앞에 전개되었다.
최정자 시인의 시를 낭송하는 김명순 씨의 정에 겨운 진지함과 블랙베리를 손에 든 황미광 씨가 "아, 그렇다며는..."하면서 끄집어 낸 '이민 문학'이라는 단어의 심각함에서 드디어 나는 '결국은 외로운 이민자'와 '그래도 문학인'이라는 두 개의 면을 보았다.
시의 양면이 아니라 나의 양면이었다.
문학공부라는 제목 하에 사람 얼굴을 보려고 그리고 또 일상에서 좀 벗어나 보려고 멀리 놀러 나온 나.
벌써 다음 달 문학 강좌를 기다린다. 이제는 많이 정겨워진 얼굴들을 만나볼 기대만으르로도 바야흐로 신입회원의 옷을 벗는 기분이다.
이제 더 이상 '신입'이라는 포근함에 안주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조마조마한 의욕이 솟는다.
* 이글은 김자원 회장이 발행하던 <NY 문협회보> 2010년 6월 호에 실렸다.
* 노 려: 2009년 10월 가입.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3 | 레이스 꽃 길을 걸으며 / 이경애 | 웹관리자 | 2025.08.16 | 127 |
| 2 | 기억의 기슭에서 / 윤영미 | 웹관리자 | 2025.07.14 | 128 |
| » | 신입회윈의 이야기 / 노려 | 웹관리자 | 2025.07.04 | 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