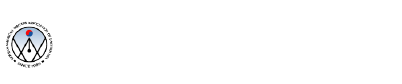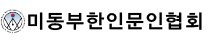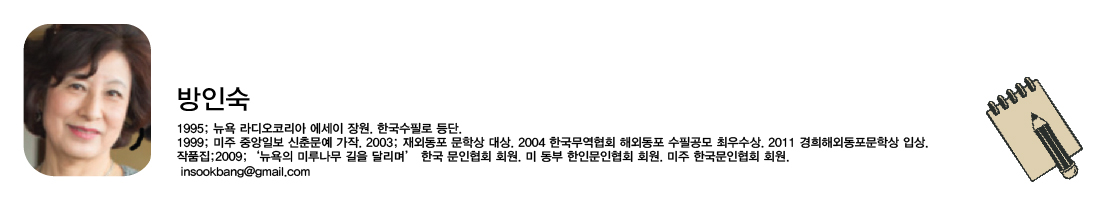
어느 하얀 겨울밤에
슈퍼마켓에서, 은은한 아카시아 향처럼 향긋함이 솔솔 풍기는 연 노르스름한 과일을 봤다. 이름을 보니 ‘Quince Apple'인데다가, 사과랑 비슷하게 생겨서 노란 사과의 일종인 줄 알았다. 그런데 양쪽이 사과 배꼽처럼 오목하지가 않고 볼록하니 나온 데다, 동그랗긴 해도 약간 울퉁불퉁하다. 껍질도 반들반들 윤기가 있고 매끄럽지도 않으면서 좀 거칠었다. 사과 감촉이 차돌이고 실크라면, 이건 빨간 연와나 광목 같은 질감이랄까. 코에 대보니, 사과 냄새와는 확연히 다른 기막히게 좋은 향내가 확 끼친다.
그걸 그리스인들이 많이 사갔다. 더 궁금증이 일어 영한사전과 영영사전을 봤지만, 'Quince Apple'이란 단어는 없고, 'Quince'는 ‘마르멜로의 열매’라고만 나와 있다. 뭔지 아리송한 채로, 벌처럼 향기에 반해 소담스럽게 사온 날, 의문은 너무나 쉽게 풀려버렸다. 남편이 보자마자 대뜸, “이거 모과 아냐!” 했던 것.
식물이름 맞추기 대회가 있다면, 참가자격 정도는 주어질 나였다. 비해서 식물이름 쓰기 시험이 있다면, 영락없이 낙제감일 남편이었다. 언젠가, 남새밭에 핀 앙증맞고 샛노란 쑥갓 꽃을, 유리잔에 꽂으면서 남편에게 물어봤었다.
“이게 무슨 꽃인 줄 알아요?
남편은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국화지 뭐!”했다. “아닌데”하고는 스무고개처럼 힌트를 주려는 찰나, 남편이 “해바라기”했다. 아무리 노랑색깔로 인한 연상 작용이라 해도, 뜬금없이 그 유명하고 큰 꽃 이름이 툭 튀어나오니, 이거야말로 게임 끝이었다. 그뿐인가. 지난봄에는 데이지 싹은 민들레로, 국화 싹은 쑥이라는 누명을 씌워서, 몽땅 뽑아 귀양을 보냈었다. 그런 실력인데 나도 몰랐던 모과를 댓바람에 맞추니 신기하면서도 미심쩍다. “어떻게 알았는데?”슬쩍 유도심문 할 밖에.
어릴 적에 시골집에 큰 모과나무가 있었는데, 감기기운만 있으면 어머니께서 모과 끓인 물을 지겹게 마시게 하셨다나. 그럼 모과가 정답임엔 틀림없다. 모과차나 모과주는 감기와 천식을 다스려주고, 모과차는 얇게 저며 꿀에 절인 걸 끓여야 더 향기롭다는 상식은 알고 있으니까. 또 과일 망신은 모과가 다 시킨다거나, 못 생기고 못 먹어도 향기만은 일품이라는 속담도 알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이상하게 여태껏 모과를 본 적이 없다. 단지 귀동냥 뿐에다 모과란 이름의 어감 때문에, 왠지 꺼무스름한 빛깔에다 고구마처럼 투깔스럽게 생겼겠지 여겼다. 맛 또한 땡감 맛이려니 하는 관념만 각인돼 있었다. 한 번 더 확인하느라, 옛날에 봤던 한국모과가 이거랑 정말 똑같았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더 크고 투박한데다 색깔도 약간 누랬단다. 하지만 냄새만은 진짜 똑같다는 데야....
이번엔 한영사전에서 모과를 찾아보니 'Chinese Quince'라고 나와 있다. 국어사전도 찾아보니 원산지가 중국인데 한국 일본 그리스까지 분포돼 있으며, 노란 열매는 기침에 특효인 약재라고 부연해 놓았다. 이젠 ‘Quince’가 모과란 사실은 명약관화해졌다. 그런 걸 모르고 나 혼자 모과 모양과 맛을 멋대로 변형시켰던 셈이었다. 또 모과차도 우리 고유의 토속차려니 여겨서 한민족만 모과를 먹는 것으로 알았다. 모과나무도 당연히 한반도에서만 자생하려니 했고. 이른바 어설프게 아는 지식은 모르니 만도 못하고, 역시 백문이 불여일견이었다. 직접 보고 아는 것과 듣기만 하고 아는 것에는 이렇게 큰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거였다.
선입관 보다는, 색깔도 곱고 향내도 상상 이상인 것에 찬탄하면서 모과를 반으로 잘랐다. 씨와 씨방은 꼭 사과였다. 단지 사과처럼 정 가운데 있지 않고 살짝 치우쳐있다. 단연코 속 쪽이 향기가 더 짙다. 맛을 보니까 약간 시큼하고 바람 든 무같이 버석버석 할뿐, 아무런 미감이 없어서 뱉을 수밖에 없었다. 역시 과일 축에 끼이려면, 필히 양심선언부터 해야겠다. 얇게 썰은걸 보리차처럼 끓였다. 그윽한 모과향이 물안개 피어나듯 온 집안에 은은히 젖어든다. 어느 방향제나 포푸리<Potpourri>와 향수가 이처럼 우아하고 겸손, 지긋할까?
이제 거실에선 청빈하고 초연한 기류가, 청아한 선율을 타고 흐르는 듯하다. 내 심연에도 ‘슈만’의 트로이메라이<Traumerei>멜로디가 흐른다. 모과차를 들고 난분 옆에 앉으니, 마치 유유자적한 선비라도 된 기분이다. 연인같이 은밀한 모과 향에 취해, 모처럼 순전(純全)하고 안온함에 잠긴다. 창밖은 우울한 회색빛 하늘 아래, 차르르 칼바람이 인다. 나목들은 불청객인 바람을 타다보니 시리고 외로움만 깊어졌다고 애소(哀訴)한다. 시인이라면 시상이 떠오르겠다.
껍질과 도려낸 속들을, 백자소반에 담아 창가의 침대 머리맡에다 놓았다. 내가 사세(些細)한데서 낭만을 찾고, 소소한 일로 심란해하거나 행복해하면 남편은 놀리곤 한다. “당신이 소녀야? 꿈 깨!” 하면서.
그러나 별도 추워서 파르르한 겨울 밤, 나는 또 심상(心想)이 많아진다. 왠지 “찹쌀떡!”하는 소리와 야경꾼의 딱딱이 소리도 그리워진다. 잘잘 끓는 아랫목에서 할머니가 구워주시던 청동화로 속의 따끈따끈하던 군밤, 포근하신 아버지 품에 있던 군고구마와 호떡, 그 달고 정겹던 단상들이 사무치게 아려온다. 그때 은밀한 모과향이 교교월색(皎皎月色)을 타고 내려온 선녀인양 백자소반에서 내려와 살포시 나를 어루만져준다.
“아! 향기 좋네! 지금 이 순간엔 부러운 게 하나 없네. 배꽃 같은 눈송이나 난분분하면 더 운치가 있겠는데”
“갖다 붙이긴. 인제는 모과쓰레기까지 모셔다놓고는 좋다고? 생뚱한 소리 말고 잠이나 자!”라고 했을 그였다. 그런데 “응! 좋은 냄새가 나긴 하네. 나도 눈이나 펑펑 왔으면 좋겠어.”하는 게 아닌가! ‘부부가 오래 동고동락하면 닮은꼴이 된다더니, 내 병<?>이 드디어 이이한테도 전이됐나?’
그러나 적요(寂寥)한 이 겨울밤엔 모과향기에만 빠져 심산해할 게 아니었다. 꿈을 깨고서 나의 자화상과 현실을 직시해야겠다. 늙어서 모과마냥 볼품이 없어진 얼굴, 삐걱대고 버석거리는 몸. 좀 더 있으면, 당당하게 “나도 여자예요!”할 수 있을라나 모르겠다. ‘나도 과일 이예요!’하며 과일 축에 끼겠다고 감히 나서지 못할 모과처럼.
그래도 모과 속에선 청아하고 은밀한 향기가 약수마냥 퐁퐁 솟는다. 내 심연에도 이런 옹달샘이 있다면, 청자나 모시 같은 기품과 지고지순(至高至純)한 향기를 품을 수 있다면, 노추(老醜)대신에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으련만. 어쩔 수 없는 노화현상마저도, 이토록이나 허망함과 초조함으로 가슴 조이며 실심(失心)해하지 않아도 되련만.
정작 그렇게 되려면, 얼마나 나 자신을 낮추고 비우며, 갈고 닦으며, 노력하면서 살아야 될까? 여러모로 부족해 참으로 보잘 것 없으면서도 욕심만 많은 내겐, 저 달 만큼이나 멀고 먼 요원한 길이다.
결국 나는 못생긴 모과만도 못하다는 부끄러운 사실을, 처연하게 인지(認知)할 뿐이었다. 이 하얀 겨울밤에...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7 | 할머니꽃<노랑꽃> | 웹관리자 | 2025.08.29 | 34 |
| 6 | 산에 빚진 것 갚기 | 웹관리자 | 2025.08.29 | 37 |
| 5 | 나야 | 웹관리자 | 2023.06.15 | 367 |
| 4 | SUNKEN MEADOW 공원에서의 수상 | 웹관리자 | 2023.06.15 | 367 |
| » | 어느 하얀 겨울밤에 | 웹관리자 | 2023.06.15 | 359 |
| 2 | 우리 가족의 지구촌 생활 이야기 < I love Paul > | 웹관리자 | 2023.06.15 | 383 |
| 1 | 뉴욕 겨울 산 의 단상 | 웹관리자 | 2023.06.15 | 3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