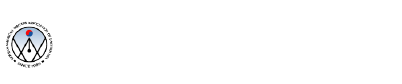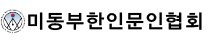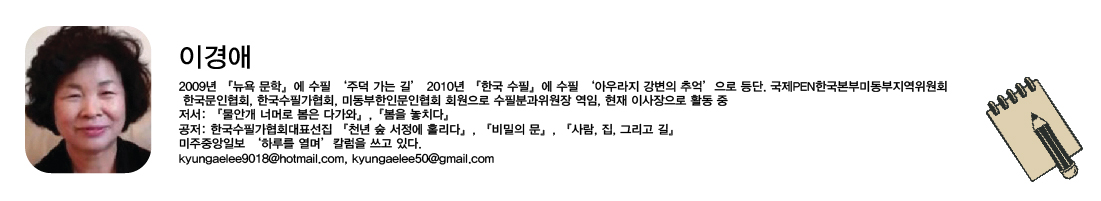
가을에 몸을 씻다
요즈음 전형적인 가을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애국가 3절에는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없이’라는 가사가 있는데, 그 때의
가을이 지금 이 뉴욕의 가을 하늘과 여전히 똑같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본다. 이 청량한 냄새
또한 그 때와 같을 것이다. 살갗에 스치는 바람은 시원하고 하늘은 끝없는 무애無碍의 바다를
펼쳐놓고있다. 숲을 털고 나온 햇빛은 화장기없는 젊은 여인의 정갈한 미소를 머금고 있다.
손을 내밀어 준다면 그 손에 입맞추며 인사라도 하고싶다.
숲은 이따금 툭 툭 도토리 열매를 하나씩 떨어뜨려 놀란 나를 뒤돌아보게한다. 내가 밟는 마른
낙엽소리가 고요한 숲을 열며 나간다. 거친 흙을 밀고 올라오는 봄 새싹의 입김이 비릿한 녹내
였다면 가을나무 결결이 터진 나무잔등에서는 열매를 익힌 단내가 난다. 풀기 잃어가는 잎사귀
마다 설은 가을을 이고있다. 붉게 늙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환호가 그들에게도 반가움일까?
숲의 끝에는 호수가 있다. 잔 물결을 그리며 출렁이는 호수물이 맑은 하늘처럼 청징하다. 어쩌
면 저리 깨끗할까? 호수 한 가운데에는 많이 깊은지 푸른색에 남색을 더한 청람靑藍의 비색秘色
을 보이고 있다. 나 말고는 아무도 없는 숲과 호수…, 나도 모르게 시나브로 물에 빨려 들어갈
것같아 퍼뜩 정신을 다잡는다. 서쪽에서 불어오는 하늬바람이 잠시 호수의 물결을 흔들고 있다.
나무들이 한꺼번에 일어나 스스스 잎을 뒤척이다 내려놓는다.
호수는 내게 말하고 있다. 무엇이 보이느냐고…, 숲에 둘러싸인 호수의 아름다운 물빛에 취했
느냐고…, 보이는것만 보지말고 호수가 품은 뜻을 찾으라 하는것 같다. 물은 낮은곳 부 터
채우며, 다투지 않고, 상대를 가리지 않으며, 움켜쥐려 하지않고, 흘러 비우기에 신선함으로
다시 채운다. 라는 상선약수上善若水의 교훈을 떠 올려주고있다.
숲과 호수의 친구는 바람이었다. 철마다 찾아오는 다른 색의 바람이 호수와 나무에 자국을
남긴다. 동풍부는 봄에 연두로 시작한 초록이 남쪽에서 밀고온 마파람으로 짙은 청록을 부려
놓고, 가을의 황토빛 붉은 단풍도 갈바람 다녀간 자리였다. 그리고 삭풍부는 겨울을 하얀
얼음으로 호수를 가둔다. 물녁 산보리수 나무에 기대어 오르는 메꽃 몇 송이 바람결에 꽃잎이
흔들리고 있다. 앞 머리를 일자로 자른 단발머리 찰랑이던 내 어릴적 동무를 닮은 꽃이다. 그
동무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겨울로 가는 가을 나무처럼 붉게 물든잎을 하나, 둘,
떨구어내며 그도 나처럼 늙어 갈까? 시인 정호승은 가을꽃을 이렇게 노래했다.
‘이제는 지는꽃이 아름답구나 / 언제나 너는 오지않고 가고 / 눈물도 없는 강가에 서면 /
이제는 지는꽃도 눈부시구나
그렇다. 가을은 상실의 계절이 아닌 눈부신 완성의 계절인 것이다. 다 떨구어낸 나무의 속
살은 또 하나의 나이테로 단단해지고 추운 겨울을 견딜 준비를 한다. 숲길을 걸으며 무겁던
상념들이 스스로 하나씩 떨어져 내리고있다. 나도 내 속에 단단한 나이테를 만들며 완성으로
가는 준비를 해야 하는 길목에 서 있을 뿐인 것이다.
잠깐 지나간 꽃시절이었다. 씨를 얻은 기쁨때문에 힘든줄 몰랐던 한 생애, 이제 남루한 옷
헤지고 벗겨져 맨 몸뚱이로 선다해도 부끄럽지 않다한다 나무는….
모든 자연이 우리의 인생과 닮아 보인다. 다시 세상으로 가는 구부러진 외길을 향해 걸음을 내
딛는다.
공활空豁한 하늘에 평정平靜이 높이 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