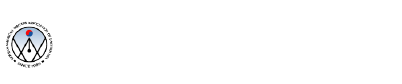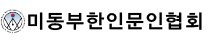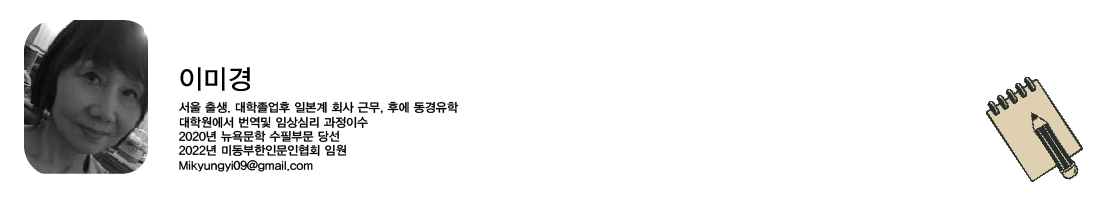
바닷가가 고향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릴적,기억컨대 밥상엔 늘 비릿한 등푸른 생선이
조리법을 달리해 올라왔다. 외려 지금보다 다양한 종류의 생선을 먹었던듯 싶다. 모양도 생생하게 여럿을 꼽을 수
있으나 그중에서도꽁치,고등어는 서민 밥상의 꽃이었다.
식성이 누구왈, 까탈스러워서-해서 메뉴 선정에 과감치 못함-나는 거의 같은 음식을 주문한다.
일행의 반(?)격려에 힘입어 주문지를 뒤적이다가도 걸국 나는 ‘고등어구이'로 결론을 맺는다.
나의 구차한 변명으로 말하자면, 이 놈은 조리후 며칠간 잔여 냄새에 시달리므로 집에서는
먹기힘든, 혹은 단백질,핵산이 풍부해 먹어줘야한다는 다소의 강박감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가
좋아한다는 것이다.
그 식당의 예의, 나의 단골 메뉴는 특히 훌륭했다. 항시 자르르 윤기가 흐르고 절대 태운 바
없이 앞뒷면이 고르게 노릿노릿 하고 적당한 크기의 통통함에 살은 보드러왔다. 이런 저런 일로
만남의 장소가 공교롭게도 같은 집이다보니 연 삼일 그 놈의 고등어를 대했다. 항상 그렇듯
첫날은 그야말로 대만족, 항상 나를 배반하지 않는 성실한 맛이었고 둘째날은 먹는데 평소보다
다소 시간을 요하며 뒷면은 거의 남기는데 그쳤고 세째날에는 주문한 그 놈을(나의 우둔함을
!)보는 순간 목구멍 저 깊은 곳에서 일종의 거부의사를 보내왔는데 미련하게도 애꿎는 전날
먹은 음식을 탓해가며 그저 밀어넣은게 화근으로 그 다음, 그야말로 흑역사의 서막이었다.
솟구쳐오는 미식거림에 머리는 지끈거리고 배에선 개구리 합창이 들려왔다. 방과 화장실과의
거리는 왜 그리 먼걸까, 아예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변기를 부여잡고 토해대던 그 밤. 몸은
오슬거리고 전신의 마디마디는 왜 그리 쑤셨는지.
한동안 꼬끝에 맴도는 떠나가지 않는 냄새, 나를 비롯해 접하는 모든 것에서 예의 비린내가
감지됐다. 다행히 천성이 단순해서인지 - 주위에 어릴적 참외를 먹고 체한 기억으로 일생을
참외를 입에 대지 않은 사람이 있다 - 그 증 상은 그쯤에 그쳤고. 어찌됐든 고등어와는 소원한
관계가 되었다.
그즈음 그 식당이 고기 전문점으로 바뀌고 그 메뉴는 자연스레 메뉴판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고기를 그닥 즐기지않는 나는 당연히 발길을 끊었고 이런저런 이유로 그 식당은 사양세로
접어들었고 급기야 폐업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전해들었다. 세금 포탈, 종업원 시간외 수당
미지급 등 뒷소문이 분분했으나 떨떠름한 기억이 꽤 오래 갔다.
지금은 의연한 자세로 고등어에 임한다. 의욕이 솟구쳐도 나름 방침을 정하고 말하자면
생각이란 것을 하고 다른 메뉴에도 눈길을 주는 것 또한 장족의 발전이다.
햇빛이 창으로 스며들어 우리 앉은뱅이 식탁을 비추고 우리 가족,까까머리 오빠, 언니
,엄마,아빠 막내인 내가 둘러앉아 구운 고등어에 된장국을 곁들여 먹는 정경. 엄마는 때때로
가시바른 고등어 한점을 밥위에 올려주었고 아빠는 '어두육미'운운하며 내가 헤쳐놓은 생선
머리만 가져다 드셨다. 아빠가 정말 생선 머리만 좋하하는게 아니란 것을 나중에 알았지만.
지나간 것은 우리는 추억이라 부르고 가슴에 자리한 그 아련함으로 지치거나 외로울 때
초콜렛처럼 조금씩 꺼내먹는 활력소랄까.
어찌하랴. 이 미천한 나는 오늘도 고등어란 놈을 뒤적이고 있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