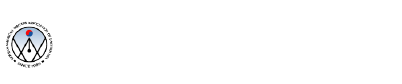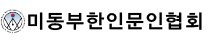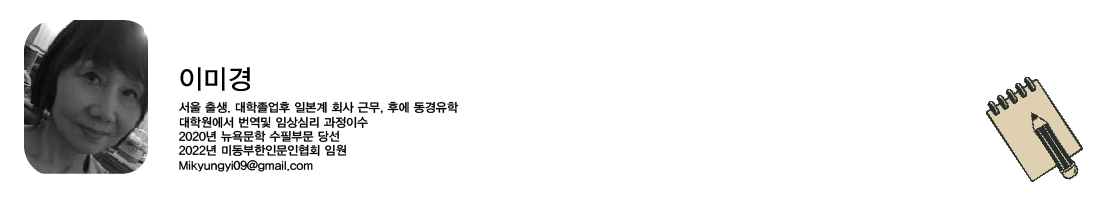
수화기 너머에선 다소 떨리고 기대감에 찬 음성이다.너무 오래간만이나 혹 이 번호를 쓰신지
오래되셨느냐고 수화기 너머는 묻는다. 역시 오래동안 이 번호만 썼었노라고 대답하자 한풀죽은, 그 역시
조심스럽게 소식 끊어진 올케 운운하며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전화는 끊겼다. 나 역시 두서없이
기다리는 전화가 있다. 이십여년 연락이 두절된 손위 오빠로 문득, 바랜 세월 속에서 기억의
어디쯤에선가 멈춰진 얼굴을 드밀곤 한다. 이런 이유로 내게 걸려온 모르는 번호를 매정히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일전엔 몇번에 걸쳐 장문의 멧시지가 왔었다. 내용에 의하면, 이
전화번호의 주인공인 “나"는 이혼한 그들 사이의 아들 양육비를 오랜 기간 체납한 파렴치한
아빠이다. 전송자인 그녀는 “우리"의 불행했던 결혼생활(전적으로 내 책임)이며
아이문제, 경제적인 문제로 끊임없이 “나"를 질책하고 있었다. 그러다 말겠지 했으나 나중엔
대답을 회피하는 죄까지 추궁당할듯하여 -나는 통념적인 개념으로 아빠가 될 수
없어요.(논쟁의 여지가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므로, 표현에 유의했음)여자거든요. 다시한번
전화번호를 확인해 보시기를-라고 응답을 했음을 끝으로 메시지는 더이상 오지 않았다.
우리는 엄지와 새끼 손가락을 귀언저리에서 가볍게 흔드는 제스쳐로 “전화하시오"한다. 이는
어찌보면 언젠가 밥먹자와 비슷한 경우로 관계성에서 선을 긋기가 애매할 때, 이를테면 어떤
여지를 남기는 수단이 되는 경우도 흔치않게 있다.
전화기가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절의 일화는 참 많기도하다. 나 역시 쓴 웃음을 짓게하는 사건이
있었다. 서울역 시계탑 앞(애고, 장소 선정이 너무 원색적이었다. 지금 생각함, 허나 절대
실패하지 않을 장소로, 선정에 애달픔이 있었음)에서 만나기로 한 사람이 있었다. 그가 여운이
강한 편지를 보냈고 내편에서 약속장소와 시간을 명시한 답장을 보낸 것이다. 그즈음엔
흔치않던 편지의 지체로 결국 그 장소에 그는 나오지 못했다. 기다리다 우울하게 귀가했더니
예의 그 사람이 찾아왔었다 한다. 편지를 늦게 받아 곧장 집으로 온 듯한데 그 역시 죄 지은
모습으로 발길을 돌리더라고. - 후에 알았지만 서울역 시계탑은 한개가 아니었다. 무려 다섯이나
됐다고.어차피 어긋날 운명(?)이었음에-
전화가 없는 요즘은 가히 상상하기도 힘들다. 어쩌다 전화기없이 외출한 경우는 그야말로
모든 것에 적신호다. 저장 기능을 통해 모든 정보가 입력돼있으니 알량한 전화번호 하나
기억하지 못한다. 전화기 없이 다섯 사람을 각각의 공간에 격리해 버티는(?)실험을 한 다큐를 본
적이 있다. 일찌감치 하루 이전에 포기한 사람에, 울며 하소연 하는 사람에, 심지어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사람까지 생겨났다. 총 네 사람이 심각한 부적응 상태를 보임으로 실험은
종료되었다. 이는 전혀 생소하지않은 우리 대다수의 이야기이다. 누군가를 혹은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소위 ‘킬링타임" 의 공신자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전화기를 들여다보는
사람을 흔치않게 본다. 나 또한 무의식적으로 전화기를 들여다 본다. 누군가의 오지않는 연락을
기다리고, 최근 찍은 사진도 돌려보고 심지어 내일 날씨는 어떨까에도 관심을 가져본다. 내가
전화기를 소유한게 아니고 전화기가 주체가 된지 오래전 인 듯하다.
나는 이 빠르고 엄청난 편리함을 조금 반납하고 싶다. 아날로그 시대의 나는 편지를 쓰는 것도
받는 것도 여전 좋아한다. 펀지가 닿았을 날짜를 계산해보는 줄거움이 분명 있었다. 조금
돌아가고, 천천히 가고, 때로는 역주행하며 머리속에의 한줄기 바람을 생각해본다.
날로 스마트해져가는 시대에 제대로 발맞추지 못해 엇박자인 역시 나의 마음뿐의
반란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