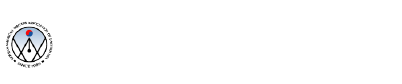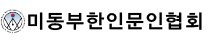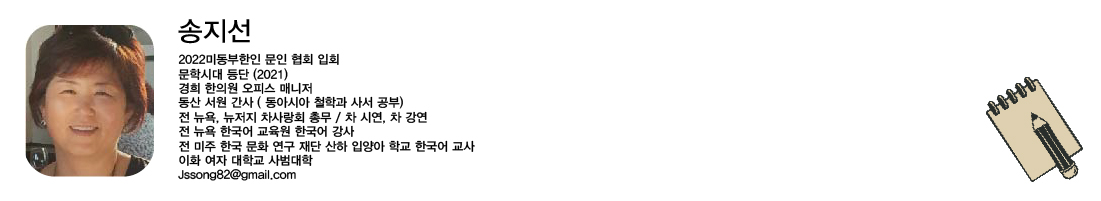
Q13 버스
215-02, 23 rd Road, Bayside, NY 11360. 열흘 전에 도착한 승혜의 뉴욕집 주소다.
남편이 편지에 썼던 바다가 보인다는 그 집이다. 목을 빼고 아무리 봐도 승혜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바다는 있다고 했다. 8월도 절반이 넘어가는 한여름, 포플러 나무 이파리가 초록에 초록을
덧칠해 어둡기까지 한 녹음을 발산하고 있다.
승혜는 앞장선 시부모님의 뒤를 따라 QM2 버스에 오른다. 버스에 올라서자 아스팔트의 열기에
부풀어 있던 블라우스 소매 안으로 서늘한 에어컨 바람이 훅 밀쳐 들어온다. 뉴욕의 익스프레스
버스도 강남 터미널에서 탔던 천안행 고속버스와 별반 다른 게 없다. 몇 블록 달리다가 막다른 길
모퉁이를 돌자 승혜의 눈앞에 바다가 나타났다. ‘아 바다가 있었네…’ 버스는 그렇게 잠깐
대서양을 구경시켜 주더니 어느새 알록달록, 각양각색의 자동차 행렬이 가득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 ‘Back to the Future’ 영화 광고판이 화려한 색감을 자랑하며 버스 앞으로 다가온다. ‘서울에서
저 영화를 못 보고 왔는데..’ 승혜는 ‘내가 자막이 없는 저 영화를 볼 수 있을까?’ 잠시 엉뚱한 의문을
가져 본다. 커튼이 달려 있는 차창 밖, 스치는 풍경하나 간판하나도 놓치지 않을 각오로 뚫어지라
보던 승혜는 미드타운 터널 싸인을 읽는다.
내린 곳은 맨해튼 36가 브로드웨이란다. 북적거리는도로 앞에 헐리우드 영화에서 봤던 맥도날드
햄버거 집이 있다. 도보는 국수 기계 같다. 구멍을 빠져나오는 국수가락처럼 사람들이 밀려
나온다. 두 어른의 꽁무니를 쫓아 부지런히 걷다 보니 눈에 다정한 한글 간판들이 불쑥 나타났다.
‘뉴욕 곰탕’, ‘상업 은행’.. ‘아하 여기가 32가 코리아타운 이구나..’
같은 한국 사람인데 그들은 명동거리의 서울 사람들이 아니다. 은행을 들어서자 시커먼 얼굴의
흑인 경비원이 무뚝뚝하게 쳐다만 본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싹싹한 유니폼의 여직원은
없네~’
서울에서 승혜 앞으로 송금된 돈을 찾으러 왔다. 계좌를 열고 이체를 하고, 여기저기 싸인을 하니
다 되었단다. 신혼 방 꾸밀 돈이다.
시어머님은 점심 먹고 집에 가라며 “너 서울에서 맥도날드 햄버거 못 먹어 봤지? 서울에는 없는
거다. 한번 먹어 봐라, 맛있다!” 하신다. 세 사람은 아까 버스정류장 앞에 있던 맥도날드 가게로
들어갔다. 주문은 정장을 하신 시아버님 몫인가 보다. 장소와 때에 상관없이 시아버님의 차림은
세종문화회관 커피숍에서 처음 뵈었던 그때처럼 늘 신사복 차림이셨다. 며느리와 아내를
이층으로 올려보내더니 조금 있다가 한 상 가득한 쟁반을 들고 계단을 올라오신다. 승혜는
어정쩡하게 일어나기 했지만 이미 성큼 걸어오신 시아버지가 쟁반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신다.
거기에는 엄마가 오이지 담글 때면 늘 올려놓던 돌덩이만 한 햄버거가 기름 냄새를 듬뿍 품은
감자튀김과 콜라를 동반하고 있다.
승혜는 저 큰 햄버거를 어떻게 먹을 수 있을지 대책이 서지 않아 잠시 머뭇거린다. 어느 한 쪽도
모가 나지 않은 그 빅맥을 새침하게 작기만 한 자신의 입을 얌전히 그러나 최대한 크게 벌려 한 입
2
베어 문다. 고기 누린 내가 물컹 물린다. 겨우 반을 먹었다. 프렌치프라이와 콜라가 없었다면 결코
함께할 수 없었던 고기 맛이다. 두 어른은 맛나게 드셨다. 두 분의 입맛이 승혜는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안도감마저 느낀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엉뚱한 감상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뉴욕의 서브웨이를 경험 시켜 주신다. 세븐 트레인의 공기는 진정 빅맥의
누린 맛의 결정체였다. 삼선동 시장 단골 정육점에 들어선 듯 했던 전철 칸을 벗어나 바깥으로
나오니 이곳은 세븐 트레인의 종착역 플러싱 루즈벨트 애비뉴라고 한다. Woolworth, Stern,
Alexander, Chase Bank, 한글 간판은 없다. 대신 한국 사람들은 많다. 야채 가게들이 즐비한 거리, 그
상점 안에서 보이는 얼굴들. 오후 늦게 오는 조간신문, 한국일보를 반갑게 집어 들었을 때, 승혜는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1면 기사들, 청과상조니, 세탁협회니, 하던 제목들이 왜 일면을 장식했는지
어슴푸레 알 것 같다.
시부모님은 볼 일이 있으니 먼저 집에 가라며 Q13 버스를 태워 주신다. “내리는 곳은 알 수 있겠니?
벨 블러바드, 우리가 탔던 자리에서 내리면 되는데..” “네, 갈 수 있어요” 어디가 어디인지는
몰라도 벨 블러바드 23 애비뉴에서 내리기만 하면 된다. 그도 안되면 도서관 건물만 알아보면 내릴
수 있다. 아무것도 없이 침대만 덩그러니 놓인 신혼 방이 떠오르며 그리움이 울컥 몰려온다.
Q13 버스는 노던 블러바드란 길을 한참이나 가고 있다. 버스 천장 아래 붙어 있는 노선표를 보니 벨
블러바드까지는 좀 여유를 가져도 되겠다. 길거리에는 상점들이 즐비하고 여기저기 뽑아 달라고,
투표하라는 선거 팻말이 블록마다 꽂혀 있다. ‘Ed Koch for Mayor ‘85’, ‘Vote on November 8’
‘아, 저 사람이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까치 시장이구나..’
드디어 버스가 오른쪽으로 크게 기울며 벨 블러바드로 꺾어진다. 이제 내릴 준비를 해야 한다.
얼굴 언저리에 힘이 들어간다. 평소에 잘 마시지 않던 콜라 탓일까, 작은 입으로 크게 먹어야 했던
세상에서 제일 불편했던 빅맥의 누린 맛 탓일까. 오이지를 누르던 돌덩이가 승혜의 위장을 누르는
듯 명치 아래가 묵직하다, 아랫배가 당기며 뒤틀린다. 버스는 차곡차곡 페이지 넘어가 듯 블록마다
선다. 운전석 위 전광판에서 친절하게 Next Stop is – 하며 사인이 나오니 미리 준비만 하면 되겠다
싶은데, 버스가 서기 전이면 ‘띵’ 하는 소리가 먼저 나고 내릴 사람들이 일어선다. 이건 분명 내가
내려야 하니 버스를 세워 달라는 신호인데, 승혜는 도무지 어디를 눌러야 하는지 아무리
두리번거려도 버튼이 안 보인다. 명치는 점점 딱딱해지고 창자는 트위스트를 추는 것 같고, 냉장고
같은 버스 안에서 오한이 나기 시작한다. 이제 세 정거장만 남았는데, 승혜는 필사적으로 내릴 듯한
사람의 행동을 감시하지만 띵 소리의 순간 포착은 매번 실패하고, 소리는 이미 천장 높이 증발해
버린 뒤다. 운전석 바로 뒤에 앉았던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나더니 손을 창문틀로 가져간다. ‘아!
드디어 알았네, 저기였어?.. 휴 우..’
승혜는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벌떡 일어나 창틀로 손을 뻗는데, 어디선가 ‘띠잉!’ , 이런!
버스를 내린 승혜의 다리는 풀릴 대로 풀려 주저앉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귓가에서 띵소리의
여운이 사라질 때, 이 땅에서 살아갈 자신감도 스르르 빠져나가고 만다.
아스팔트마저도 낯설기만 한 길에서, 뙤약볕 모래사막을 기어가는 작은 개미처럼 작은 발걸음을
끌며 걸었다. 초인종을 누르고 조금 있으니 이웃 집 여자같은 큰동서가 모습을 나타낸다.
“잘 다녀왔어?”
3
순간, 승혜는 이층 화장실로 돌진했다. 명치를 누르던 빅맥의 잔재물이 몸 밖으로 튀어나오자 ‘띵’
소리로 부터의 해방감과 함께 자신의 몸을 빠져나갔던 온기가 스멀스멀 단전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을 느낀다. 오롯이 승혜를 기다려 주던 유일한 가구, 열흘을 함께 한 침대에 온몸이 엎어지는데,
아래층에서 전화벨 소리가 들린다. “네, 아버님, 조금 전에 들어왔어요, 체했는지 좀 토하더니 누운
것 같아요.”
큰 대자로 누운 승혜의 시야에 창문 밖 새파란 하늘이 들어온다. 거기엔 방금 지나간 비행기가 남겨
놓은 하얀 연기가 미처 따라 들어 가지 못 한 꼬리 마냥 남겨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