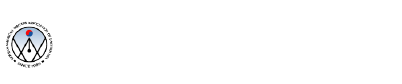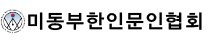상실의 예감
나는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버스로 삼십여 분 이상 걸리는 곳으로 다녔다. 가끔 그 시절에 유행하는 가요나 팝송이 조용한 버스안을 가득 채우곤 했다. 그런 버스안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상상을 하며 눈물을 짓고는 했다. 감기 한번 안 걸리시는 건강한 아버지셨고, 엄하셨지만 자녀들을 사랑하신 아버지셨다. 그런데 왜 그렇게 “ 상실의 예감“ 을 일찍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의문이다.
내 나이 27세 때, 아버지께서는 간암 판정을 받으셨다. 당뇨가 있으셨고 그 시대 때는 연로하신 나이셨기 때문에 수술도 쉽지않은 상태였다. 간간이 계속되어 온 나의 상실의 예감은 2년동안 더욱 깊어졌고, 앞으로 일어날 실제의 상실에 숨이 턱턱 막혀왔다. 책에 적혀 있는대로 간암의 말기 증상이 아버지께 차례로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은, 헐은 상처위에 찬 갈고리를 대는 듯한 지독한 고문이었다. 아버지를 살려 주시면 당신을 정말로 진실로 믿겠다며. 모든 신에게 타협을 했고, 모든 신이 서로 싸워 노할까봐 하나님만을 상대로 꼭꼭 하며 언약을 받아냈다. 타협안에서 잠시 위안을 찾을 뿐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정신이 멍해지고, 내 팔위에 내 손을 얹어가며 차가운 아버지의 몸과 내 몸의 따뜻함의 이치를 생각해 내야했다. 간에는 칼을 대지않는 것이라며 수술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친지 어른들이 원망스러웠고, 상실을 막을 수 없었던 스스로에게 화가 나고, 막을 능력도 없었지만 두고만 볼 수밖에 없었던 나를 비롯한 가족 모두에게 분노가 일었다. 편히 쉬어 보신 적 없이 일만 하시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실의 불공평함에 화가 났고 죄책감을 수반했다. ‘ 만일, 만약 그랬더라면’ 이란 후회와 타협이 여전히 섞인 채, 수용의 단계로 들어갔다. 아버지의 빈자리는 이 세상이 텅빈 긴 터널처럼 느껴지고, 그때까지는 생각하지 않은 결혼이란 것을 생각함으로써 또 다른 인생의 장을 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했다. 아버지의 기일과 남편의 생일이 같아 남편을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라 생각했다. 남편은 나와 동갑내기였지만 아버지처럼 자상하고 따뜻했다. 두 아들의 육아와 나의 일과, 새로 시작된 시댁의 관계맺기로 상실의 고통은 아쉬움을 뒤로한 채 점차 옅어질 수 있었다.
아버지의 나이가 되어감에 따라 상실의 예감은 여러 갈래의 모습으로 다가온다. 특히나 미국에서는 관계의 상실에 익숙하다. 짧게 연수를 왔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사람과의 이별이나, 몇 년 동안 이웃으로 같이 정을 나누다가 한국이나 다른 주로 이사를 가게되면 상실의 예감안에서 무던해지려고 애를 쓰고는 한다. 이제는 예감을 하지 않았어도, 불현듯 부고의 소식을 접하더라도 그리 낯설지만은 않은 나이가 되고 있다. 상실을 받아들이고 그 상처만큼 애도의 기간을 충분히 가짐으로, 녹아들고 소화가 될 때까지 새김질을 해야 한다. 가슴이 아프지만 공유했던 많은 시간들을 함께 한 지인들과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 새기고 또 새기어 딱딱한 이물질이 아닌 삶의 한 부분으로 녹아들게 한다. 상실은 삶의 여정의 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