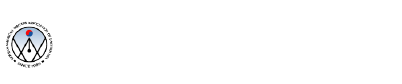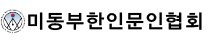열리는 또 다른 문
훅훅 지나가는 내 삶의 시간은 많은 기억과 숱한 시간들로 이제는 제법 묵직하다. 삶의 여정마다 기대대로 열렸던 문들과 전혀 예견을 하지 못했던 또 다른 문들의 열림으로 묵묵히, 그리고 더 먹는 나잇대의 숫자만큼 스피드를 내며 나의 인생의 실타래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풀어지고 있다.
1남5녀 중 셋째 딸로 태어나 몇 번째라는 서열의 숫자로만 매김 되었던 나는 부모님께 그리 새로울 게 없었다. 두 살 때 앓은 디프테리아는 서열의 숙명으로써 자칫 무관심해 질 수 있는 양육환경을 어머니의 적절한 돌봄으로 이끌어 내주는 지킴이 역할을 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기본적 토대를 마련해 준 작은 뜨락문이었다.
나의 최초의 어린 시절의 기억은 앞마당 한켠에 있는 펌프식 우물가에서 자매들과 함께 얼굴과 다리를 씻고 있는 광경이다. 몸을 씻고 있는 손이 야무지다고 칭찬해 주시는 어머니의 끊임없는 격려와 관심은 내가 무엇이든 필요한 것을 꺼낼 수 있는 창고문이었다.
많은 아이들이 바글바글한 운동장이 생각나는 초등학교의 기억으로는 먼저, 신사임당의 모습으로 예쁘게 조용히 앉아, 노란 옥수수빵을 얻어 먹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으나 번번히 받지 못한 슬픈 기억은, 간절히 원할수록 더 큰 상처임을 알게했다. 또 다른 기억은, 비가 쏟아지고 바람까지 불면 우산을 쓰고 학교를 가는 것이었다. 그 시절 흔했던 퍼런 비닐 우산은 바람이 조금 세차게 불면 홀랑 뒤집어지며 나에게 당혹함과 창피함을 주었다. 우산의 사투는 버티는 것 자체가 답일 때가 있음을 알게 해주며. 옥수수빵의 간절한 기억과 절박한 우산의 싸움은 세상을 맞설 수 있게 해 준 들창문이었다.
남자 아이들이 축구를 하며 뻥 차내는 공에 두려움과 무서움이 각인된 나는, 땡땡한 공은 그 자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도 나에겐 흉기였지만, 겁나게 축구를 좋아하는 두 아들 때문에 운동장의 공포를 이길 수 있었다. 의지와 끈기만 있으면 길이 열림을 배우게 해 준 두 아들은 커다란 현관문이었다.
중학교 때 읽은 고전 책들은 나의 사고력을 확대 시켰으며, 삶의 강파름을 잘 견디게 해 준, 그리고 세상과 사람을 보는 눈을 깊게 만들어준 햇살문이었으며, 미국에 와서 수회에 걸쳐 다녔던 가족 여행 역시, 넓은 시각을 가지게 해 준 지혜의 싸리문이었다.
미국 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여러 사람들과 각양각색의 삶의 모습에서 ‘깨어라’ 라는 말의 중요성을 새겨보게 되는 계기가 되며, 그리 좋은 모습이 아닌 사람의 언행은 절제의 역할을 하는 배움의 빗장문이었다.
나이가 들수록 상실의 삶을 살게 되지만, 아직 가져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던 세상의 세세한 부분에 경이로움을 가지며 또 새로이 열리는 문을 기다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