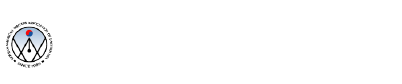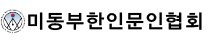고향의 두 부자(富 者)
내 고향에는 옛부터 부자가 많았다. 인근 지방의 세미(稅米)를 거두어
보관하는 세곡창이 있었다고 한다. 뱃사람들은 ‘돈 실러 가세, 돈 실러 가세,
법성포로 돈 실러 가세’ 하는 노래도 지어 불렀다고 한다.
봄 부터 가을 까지 출어기에는 여러 종류의 고기가 많이 잡히어 고향마을은
늘 풍족한 느낌이였다. 바다에서 돈을 건진 사람들은 마을 뒷편에 펼쳐진
농토에 묻어두어 해마다 안정적인 소출로 땅마지기를 늘려 나갔다. 그러나
이상스럽게도 고향의 부자들은 대를 잇지 못하고 당대에 끝난다고 사람들이
모이면 이렇궁 저렇궁 떠들어 댔다. 고향의 산세 탓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면 부자들이 조상의 묘자리를 잘못 썼다고 입방아를 찧는 사람들도 있었다.
김 부자네는 큰 어선을 여러 척 가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을 부렸다. 마을의
서편에 넓게 자리 한 김 부자네의 여러 채 기와 집은 사람들에게 위압 감을
주었다. 대문에서 본채까지는 한참을 걸어 갈 정도로 처음 찾아가는 이들에게는
꽤 멀게 느껴 졌다.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관계되는 일로 생계를
유지하다 보니 김부자는 어른이시고 부인은 마님이라 부르며 상전으로 떠
받들었다.
어느 해인가 큰 어선이 엄청나게 큰 상어를 잡아 왔다. 바다에서 건져 올리는
데 어부들이 몇시간을 씨름해서 지친 상어를 간신히 끌어 올렸다고 한다.
옛부터 바다 마을에는 거북이나 상어 같은 큰 고기를 잡으면 놓아주어야
이롭다는 말이 전하여 왔다. 상어 때문에 비싼 그물이 다 망가져 더 이상 조업을
할수 없었고 사공(선장)은 고민하다가 주인인 김 부자에게 사유를 설명하기
위해 상어를 싣고 포구로 돌아 왔다.
부둣가에 길게 누어 있는 큰 상어를 보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몰려 들었다.
인근 마을에도 소문이 퍼져 난생 처음보는 구경거리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장터
처럼 몰려 왔다. 상어의 배를 가르는 날이 구경의 마지막 볼거리 였다. 뱃속에서
소화가 덜 된 크고작은 고기들이 쏟다져 나올 때 사람들은 와-하고 함성을
질렀다.
그 다음 해인가 이른 가을에 그 어선은 그물을 미리 거두어 드리지 못해
폭풍에 밀려 난파 되고 말았다. 그 다음 해인가 김 부자네 작은 배도 폭풍속에
사라졌다. 큰 배에서 남편을 읽고 작은 배에서 자식을 잃은 아낙이 김 부자네
대문 앞에서 발을 뻗고 대성통곡하는 모습은 차마 볼수 없었다. 실종된
어부들의 유족들에게는 논마지기나 밭 뙈기를 떼어 주고 달래었다.
마을 사람들이 모이면 그 상어 때문에 사단이 난것이라며 김 부자네가 망조가
들었다고 수근거리곤 했다 엎친 데 덮친다고 큰 마나님이 아편을 한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김 부자네 아들 딸들은 외지에서 학교를 다녀 학자금도
만만치 않게 들어갔다. 남아있는 중선 한 척으로는 그집의 씀씀이를 감당하지
못해 논과 밭을 팔기 시작했다.
어느 해에 김 부자가 갑자기 죽고 마나님도 고생하다가 가고 서울에서
공부하던 아들이 내려 와 사업을 이어 받았으나 전혀 다른 길을 걸어 온 이가
기울어가는 사업을 일으키기에는 역부족이였다.
위엄 높은 김 부자네 기와 지붕 위에 늘어가는 잡초를 지나가는 사랍들이
쓸쓸이 바라 보았다.
고향의 다른 부자 오씨는 어렸을 때 무척 가난 했다. 여름의 모시 옷을 가을
찬 바람이 불 때 까지 입어야 했고 무엇 보다도 참기 어려운 것은 배고픔이였다.
홀로 된 어머니는 이른 아침부터 밭으로 김 매려가고 집에 남은 아이들은
허기를 채우는 것이 일이였다. 한참 자랄 때인 아이들에게는 하루 두끼로
보내기에는 여름의 해는 너무 길었다. 아이들은 먹을 것을 뒤지다가 부엌
천정에 매달려 있는 바구니에 눈이 갔다. 어머니가 일 나가기 전에 삶아 쉬지
말라고 천정에 걸어 논 삶은 보리쌀이였다. 아이들이 키가 작아 보리 쌀
바구니를 내릴수 없어 동생을 어깨에 태워 간신히 바구니 바닥에 손이 닿을수
있었다. 동생은 바구니 바닥을 밀어 올려 내렸으나 바구니를 붙잡지 못해 그만
아궁이 앞으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다. 삶은 보리 쌀은 잿더미 위에 쏟아 졌다.
아이들은 보리쌀을 가려 내어 물에 씻어 먹으며 엉엉 울었다고 한다.
좀 자라자 부둣가에서 장사를 시작했고 돈을 모아 배를 사고 바다에서 돈을
건지는 대로 땅에 묻어 큰 부자가 되었다. 뒷산에 오르는 중간에 커다란
기와집을 사드려 부자의 위엄을 갖추었다.
오부자에게는 특이한 별명이 있었다. 돈이 한번 들어가면 나올줄을 몰랐다.
외상값을 치루든가. 부리는 사람들에게 노임을 줄 때 손을 발발 떤다고
‘발발이’이라는 별명으로 사람들은 불렀다. 젊은 친구들 사이에는 서울에서
대학에 다니는 오부자의 큰 아들이 용돈을 탈 때 꼬치꼬치 묻고 발발 떨며
준다고 그 아들이 제 아비를 ‘발발이’라 불렀다고도 한다.
어느해 가을 풍년이 들어 오부자네 창고에 나락 가마니가 그득히 쌓였다. 그
큰 아들이 용돈을 달라고 했는데 그 용도가 마당치 않아 오부자가 거절을 했다.
그 철없는 아들은 나락 창고 앞에 짚단을 쌓아놓고 불을 질렀다. 마을 소방대가
급히 출동을 했고 근처에 우물이 있어서 창고 문이 조금 타고 다행히 진화가
빨리 되었다. 그 아들은 지서로 끌려 갔다. 어쩌면 교도소에 갈지도 모른다는
말에 놀란 오부자는 지서주임을 찾아가 자식을 잘 못 가르친 자기 탓이니
한번만 용서해 달라고 싹싹 빌었다. 채면 불구하고 사정하는 지방유지의 청을
매정스럽게 거절할수 없어서 훈계방면으로 마무리 지었다.
“오부자도 자식 농사는 트자에 꼬불꼬불 해 버렸구만”
“오부자가 얼마나 깐깐이 굴었으면 자식이 그런 미친 짓을 했겠어”
동네 사람들이 모이면 제각금 한 마디씩 떠들었다.
객지에서 들은 소문에는 오부자가 갑작이 세상을 뜨고 그 자식들 끼리 재산
다툼이 벌어 졌다는 것이였다. 도시의 물을 먹은 그 자식들이 지방의 생활을
마다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도시로 옮겨 왔다면 얼마나 오래 그 재산을 지켜
냈을지 지금도 의문 스럽다.
한 부자는 펑펑 쓰다가 망했고 다른 부자는 아까워 벌벌 떨다가 쓰지도
못하고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