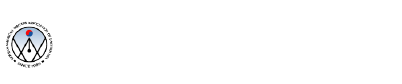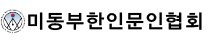처서가 오는 길목에서
올해 여름은 여느 때보다 더 무더웠다.
일하느라 일주일에 두 번씩 다니던 후러싱의 한 여름은 사람이 많이 모여 살아 나무가 많은
롱아일랜드보다 훨씬 무더웠다.
차를 타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던 그런 폭음의 한여름이었다.
숨이 찰 정도로 더운 나날들이 이어지더니 어느덧 말복도 지나고 처서가 성큼 다가왔다.
더위가 물러난다는 절기답게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한다.
매미의 울음이 시원하게 들리는 그늘이 드리워진 늦여름이라 생각했더니 어느새 여름의
잔해가 물러가듯 아침이 쌀쌀하고 밤이면 풀벌레 소리가 간간이 들리기도 한다.
귀갓길에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 Exit 35로 들어서는 서비스 길을 지나면 차장밖에는
양옆으로 나무들이 길을 내어주듯 울창하게 뻗은 풍경을 다시 만났다.
그늘처럼 드리운 가지들 사이로 들어서는 순간, 28년 전의 기억이 불현듯 떠올랐다.
아이들이 독립해 나간 지도 몇 해가 되었는데 어느새 긴 세월을 같은 집에서 살아왔구나.
집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쁘게 일하는 중에도 수목이 울창한 자연 속에서 고요하게 마음이 여백을 느끼며 망중한을
가지며 살아왔고 아이들과의 추억을 담고 있기 때문일 거다.
그때만 해도 큰아이가 겨우 여덟 살 남짓이었고 두 아이도 그런 나이였다.
우리는 세 아이를 데리고 이곳으로 이사 오던 참이었다.
밤이면 새로 이사할 집이 궁금해 괜스레 그 길을 지나가곤 했는데 양쪽으로 나무 사이를
달리는 기분이 참 좋았다.
마치 나를 감싸안는 부모님 품 같아 그 길을 달리며 마음속으로 부모님을 만나러 가듯 집
주변을 한 바퀴 둘러보고 돌아오곤 했다.
아이들을 태우고“ 여기는 우리가 이사 올 집이야”라고 우쭐하게 말하면 아이들도 덩달아
신나했다.
수리를 마친 집은 우리가 살던 이층집 콘도보다 훨씬 넓었고 카펫을 걷어 낸 바닥은
단단하고 시원한 나무로 되어 반짝거렸다.
층간 소음이 없어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다녀도 되는 집이라는 점에서 나에게 큰 안정감을
주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집은 아이들과의 추억을 차곡차곡 담는 큰 그릇이 되어 지금도 비워낼
수가 없다.
어느새 이리 세월이 흘렀는지..
28년을 함께하며 무릎까지 오던 관목들은 이제 내 키의 몇 배로 자랐고, 삼십 대
중반이었던 나는 어느새 60대 중반이 되었다.
얼마 전 뒤뜰에 자란 나무들을 잘라주고 맘대로 뻗어 담장을 메워버린 장미를 쳐주며
예쁘게 관리했다.
여전히 나무는 푸르고 그 길은 변함없이 그늘을 드리우며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각자 가정을 꾸린 지금도 여전히 이 집은 나와 함께 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나를 평온하게 해 준 길과 나와 함께 나이 먹어가는 편안한 이 집이 참 고맙다.
이사 오던 그때처럼 이제는 집을 다시 손질하고 다듬어야 할 시간이다.
가끔은 그 시절처럼 울창한 나무 숲길을 달리며 바람 속에 묻어나는 그때의 설레었던
마음을 느껴본다.
봄이면 얇은 연둣빛 잎이 가지마다 피어오르고 여름에는 짙은 녹색으로 잎사귀가 변하며
치자향과 장미의 담장이 나의 벗이 되어주었던 순간들
가을이면 붉고 노란 잎이 비처럼 흩날리며 단풍나무가 물들며 긴 겨울을 기다리던 순간들이
있던 이 길과 나의 집이다.
이 계절은 같은 모습으로 다시 오겠지만 나의 모습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간다.
이것이 인생의 순환이고, 삶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
변하지 않는 건 자연뿐이라는 것을..